혼자 있는 공간은 어디에 둘까
2025-05-26

분리와 고립 사이, 혼자 머물 수 있는 집의 방식
집은 함께 사는 공간이다.
가족이 머물고, 친구가 방문하고,
생활의 동선이 겹치는 구조.
하지만
그 집이 정말 편하려면
그 안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혼자는 고립이 아니다.
모든 소리를 차단한 채
감정을 조율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만의 호흡으로 잠시 머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허락하는 공간이
좋은 집을 만든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공간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크지 않아도 좋다.
창가에 작은 책상 하나,
주방 뒤 짧은 벤치,
현관 옆 시선을 피한 의자.
이런 자리들이
그 집의 감정 온도를 바꾼다.
완전히 분리된 서재도 좋지만
반쯤 열려 있는 방,
커튼 하나로 가려지는 구석,
파티션 너머의 틈 같은 공간이
오히려 더 부드럽게 ‘혼자’일 수 있게 해준다.
이때 중요한 건
물리적 면적보다
심리적 거리다.
시선이 닿지 않거나
소리가 적게 들리거나
등을 기대고 싶은 벽이 있거나.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사람은 거기로 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 자리가 있는 집은
사람을 조용히 위로한다.
설계자는 그런 공간을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틀 속에 남겨둔다.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필요할 땐 누구나 머물 수 있는 자리.
그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
그게 진짜 함께 사는 집이기도 하다.
#혼자의자리 #심리적거리 #회복의공간 #집의여백 #chiho
 블로그 글
블로그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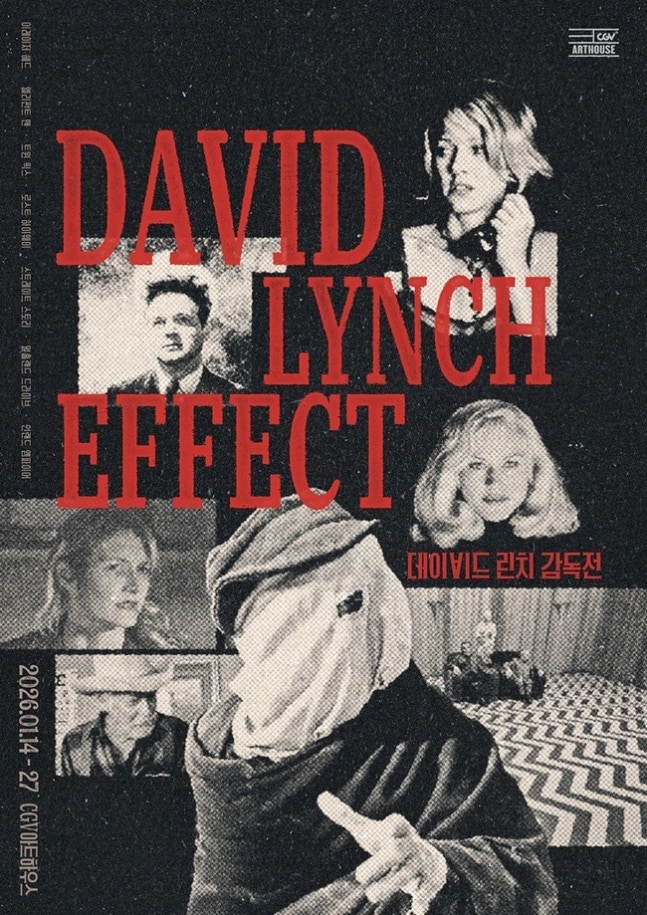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