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한 이유가 끝을 결정한다.
2025-06-03
시작한 이유가 끝을 결정한다
사람은 끝을 고민하며 시작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시작했는가는,
거의 언제나 그 일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암시한다.
처음이 가벼우면, 끝도 가볍다.
처음이 절박하면, 끝은 대개 단단하다.
처음이 타인을 위한 것이면, 중간에 흔들리고
처음이 자기 안에서 온 것이면, 오래 버틴다.
도중의 혼란은 시작의 해석으로 돌아간다
누구나 중간에서 방향을 잃는다.
'이게 맞는 건가?'
'계속해야 하나?'
그럴 때 우리는 처음의 마음을 기억하려 애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할 때 이유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
'그냥 해보려고요.'
'뭔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시작하면 뭐라도 되겠죠.'
그러니까 끝도 애매해진다.
그냥 하다 말고,
중간에 그만두고,
“별로였어요.” “상황이 안 맞았어요.”
그런 핑계들이 마지막 페이지를 대신한다.
시작은 씨앗이고, 끝은 열매다
좋은 열매는
어떤 토양에 어떤 씨를 어떻게 심었는지에서 비롯된다.
시작이란
'내가 이걸 왜 하는가'라는 질문에
거짓 없이 답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의 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끝이 허무한 사람은
시작도 가벼웠을 가능성이 높고
끝이 치열한 사람은
처음부터 진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시작의 이유’는 목표가 아니다
시작의 이유는
내가 그 일에 시간과 감정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근거다.
"난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못 견딜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끝까지 데려다주는 동력이다.
그게 없으면,
작업은 멈추고, 관계는 식고,
기획은 잊힌다.
 블로그 글
블로그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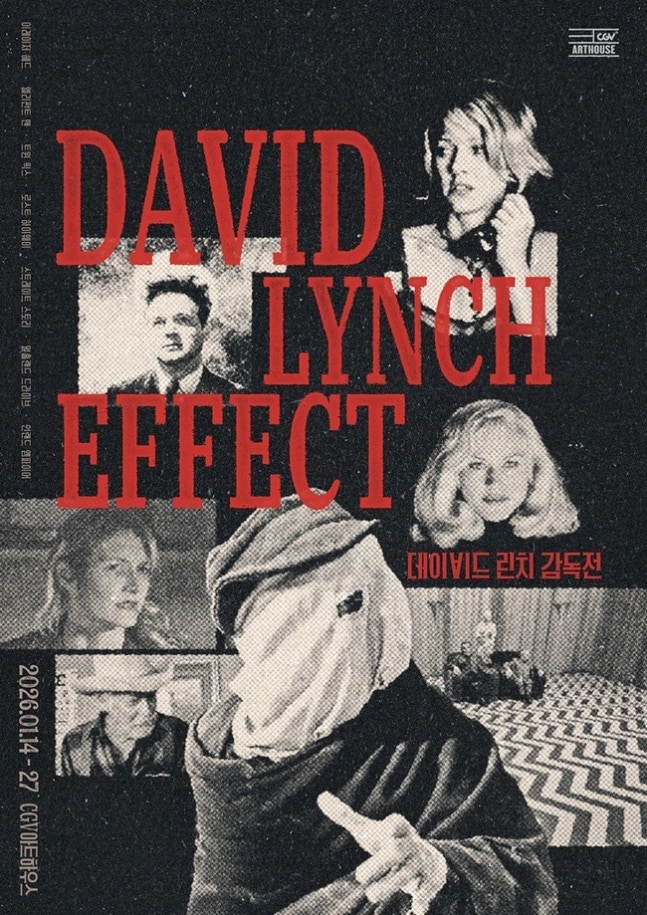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