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선 《봄바람》
2025-10-08
「봄바람」 장면별 인용 해설
1. 학원 – 일상의 균열이 시작되다
화자는 “너무나도 따분했던 일상이 문제였는지도 모른다”고 고백한다.
단조로운 직장과 가족의 루틴 속에서 ‘따분함’은 균열의 첫 조짐이다.
그 균열로 그를 끌어낸 것은 뜻밖에도 연탄배달 장씨였다.
“그건 순전히 장씨 때문이었다. 미쳤다고 생각했다. 자네도 말이야, 시방 봄바람이 분 거야.”
장씨의 춤추는 모습이 준 충격은 곧 욕망의 다른 이름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도학원의 문을 두드린다.
늙은 원장은 “제비 되려고 춤 배우면 당장 그만두라”며 경고하지만, 화자는 머뭇거리며 “건강이 좋을 것 같아서요”라며 핑계를 댄다.
이 장면은 호기심이 욕망으로 변하는 첫 번째 부정의 문장이다.
2. 첫 춘방 – 부끄러움과 욕망의 공존
첫 콜라텍 방문은 충격과 당혹의 연속이다.
그는 “미치지 않고서야 벌건 대낮에 발광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자신이 본 광경을 부정하지만,
이미 그 공간의 리듬은 그를 끌어들이고 있다.
“순간 엄청난 음악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어 머리를 흔들어 놓고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 눈치 보고 있던 심장을 사정없이 두들겼다.”
“나는 발을 떼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낯선 광경에 혼을 빼앗긴 채 장승처럼 굳어버렸다.”
콜라텍의 리듬은 화자의 심장을 두드리고, 그 심장은 곧 춤의 박자로 바뀐다.
부끄러움과 욕망이 공존하는 이 장면은 이후 몸이 언어를 대신하기 시작하는 첫 단락이다.
3. 장씨의 설법 – ‘목적을 버려야 춤이 열린다’
화자는 춤의 세계에서 스승이 된 장씨를 다시 만난다.
한때 연탄을 지던 사내는 이제 “하얀 바지를 백꼽까지 올려 입고 기름을 부어 놓은 것처럼 반질거리는 구두를 신은” 인물로 변해 있다.
장씨는 말한다.
“목적을 가지고 덤비면 춤을 망치게 된 게. 춘방에 오는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 겉은 화려해도 속은 연탄맹키로 까맣게 타 들어간 사람이 많아.”
이 대사는 단순한 교습이 아니라 철학이다.
장씨의 춤은 과부에게 복수하기 위한 도구에서, 인생을 지탱하는 리듬으로 승화됐다.
그가 ‘연탄’을 ‘춤’으로 바꾸었듯, 화자 역시 체면을 기술로 바꿔가는 중이다.
“밖에서는 연탄쟁이라도, 안에 가면 대접을 받는 것이 바로 거기야.”
이 구절은 신분·체면의 질서를 해체하는 선언이다.
‘밖’과 ‘안’의 세계가 뒤집히는 순간, 춤은 생존의 기술로 변한다.
4. 파국 – 체면의 세계와 리듬의 충돌
비밀은 오래가지 않는다.
장모와 장인은 도덕과 체면의 이름으로 화자를 몰아세운다.
“사내 자석이 그렇게 살려면 나가 죽어.”
“양반 자손이 돼 갖고 재비가 되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어디 발바닥에 땀나도록 비빈서 춤을 주느냐 이 말이씨.”
화자는 말로는 더 이상 대응하지 못한다.
“도둑질을 했습니까?”라며 반항하지만, 결국 “장인은 나를 질질 끌어다가 문 밖으로 내팽개쳤다.”
그 장면에서 체면의 질서와 리듬의 질서는 충돌하고, 화자는 완전히 문밖의 존재가 된다.
그러나 바로 그 추방이 해방의 예고다.
5. 독무(獨舞) – 봄바람, 해방의 리듬
마지막 장면은 환영과 환청이 겹친 환상적 장면이다.
장모의 욕설, 아내의 울음, 장인의 고함이 뒤섞여 하나의 리듬으로 변한다.
“랩을 하듯이 빠른 목소리로 욕설을 퍼붓는 장모는 건반, 주먹으로 가슴을 동당거리며 높은 울음을 터뜨리는 아내는 작은 북과 심벌즈, 간간히 헛기침을 하며 신경을 진정시키는 장인의 목소리는 큰북이었다.”
이 소음은 음악이 되고, 화자는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경쾌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귀에 부딪히는 칼바람이 가슴속에 이르러 봄바람으로 바뀌는 것 같았다.”
“몸은 이제 음악과 일체되어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고 차가운 겨울밤을 사분사분 걷고 있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리듬의 완성이다.
‘봄바람’은 부도덕이나 일탈의 상징이 아니라, 체면의 갑옷을 벗고 자신만의 리듬을 회복하는 존재의 해방이다.
정리: 리듬으로 다시 태어나는 인간
장면 | 인용 | 해석 |
|---|---|---|
학원 | “그건 순전히 장씨 때문이었다.” | 호기심이 욕망으로 변한 출발점 |
첫 춘방 | “엄청난 음악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어…” | 몸이 말을 대신하는 첫 경험 |
장씨 설법 | “목적을 가지고 덤비면 춤을 망친다.” | 기술이 철학으로 변하는 순간 |
파국 | “사내 자석이 그렇게 살려면 나가 죽어.” | 체면의 폭력, 리듬의 추방 |
독무 | “칼바람이 봄바람으로 바뀌는 것 같았다.” | 존재의 해방, 자아의 리듬 완성 |
결론
「봄바람」은 한 남자의 ‘일탈담’이 아니라 언어에서 리듬으로 이동하는 인생의 서사다.
그는 도덕의 언어로부터 쫓겨났지만, 리듬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다.
마지막 문장은 바로 그 선언이다.
“한 발 뒤딜 때 억울함이 깨지고 두 발 뒤딜 때 참담한 마음이 녹아 부드럽게 되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에게 봄바람은 죄가 아니라 구원이다.
그의 춤은 미친 짓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본능적 기술이다.
 블로그 글
블로그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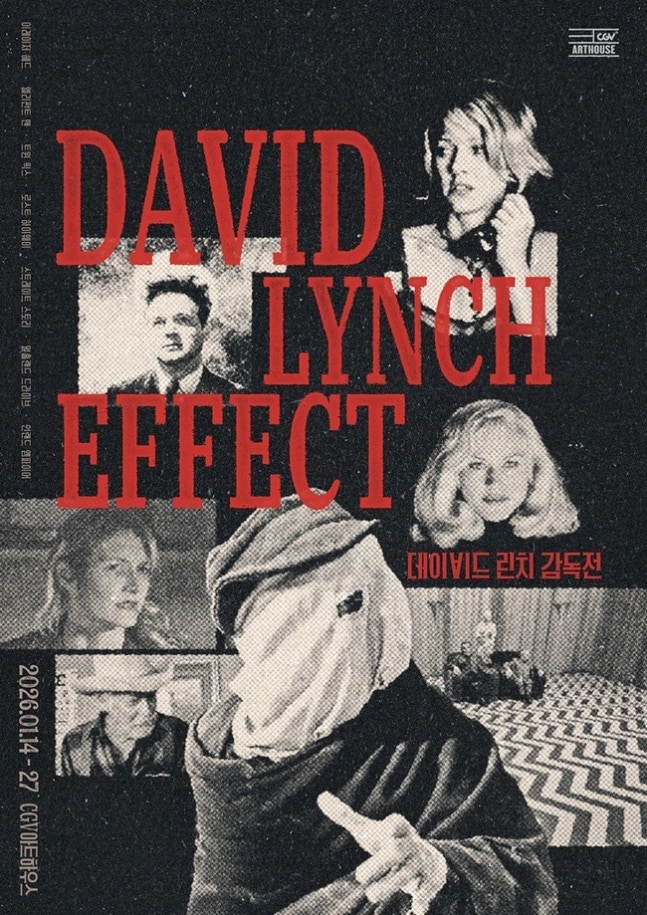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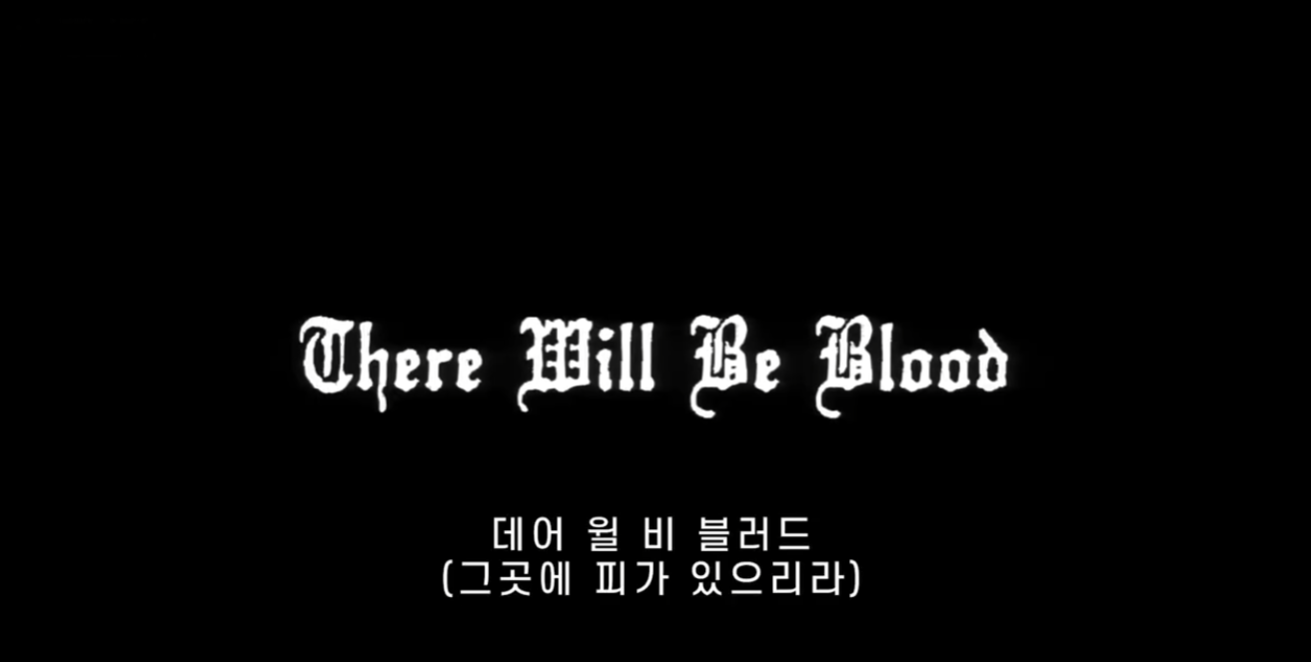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