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좋아지는 집
2025-05-26


처음보다 나중이 더 편안한 공간을 짓는다는 것
집이라는 공간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살다 보니 편해졌다는 말이 더 어울릴 때가 있다.
첫인상은 평범했지만,
걸을수록 동선이 익고,
빛이 드는 시간이 눈에 익고,
가구가 자리를 잡아가며
어느새 감정이 머무는 구조가 되는 집.
그런 집은
누군가 ‘설계가 잘 됐다’고 말하지 않아도
살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느낀다.
“그냥 좋아요. 편해서요.”
이 말은
디자인의 완성보다
생활의 밀도를 말하는 표현이다.
살면서 좋아지는 집이 되기 위해선
몇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모든 공간이 꽉 차 있지 않아야 하고,
처음부터 모든 기능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의 습관에 따라
공간이 조금씩 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
거실이 처음보다 작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작은 방이 생각보다 자주 쓰일 수도 있다.
주방 옆 틈이 서서히 수납이 되고,
창가 자리가 나만의 자리로 바뀌기도 한다.
그 모든 변화가
처음엔 예측되지 않더라도
설계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면
그 집은 점점 자기에게 맞아진다.
살면서 좋아지는 집은
고정된 디자인이 아니라
삶이 움직이면서 완성되는 집이다.
설계자는 그걸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측하지 못할 가능성을
미리 열어둘 수는 있다.
그리고 그런 집이
사람을 오래 머물게 한다.
좋은 집이란
처음 좋았던 집이 아니라
살다 보면 좋아지는 집이다.
#살면서좋아지는집 #집의시간 #생활의유연성 #공간과감정 #chiho
 블로그 글
블로그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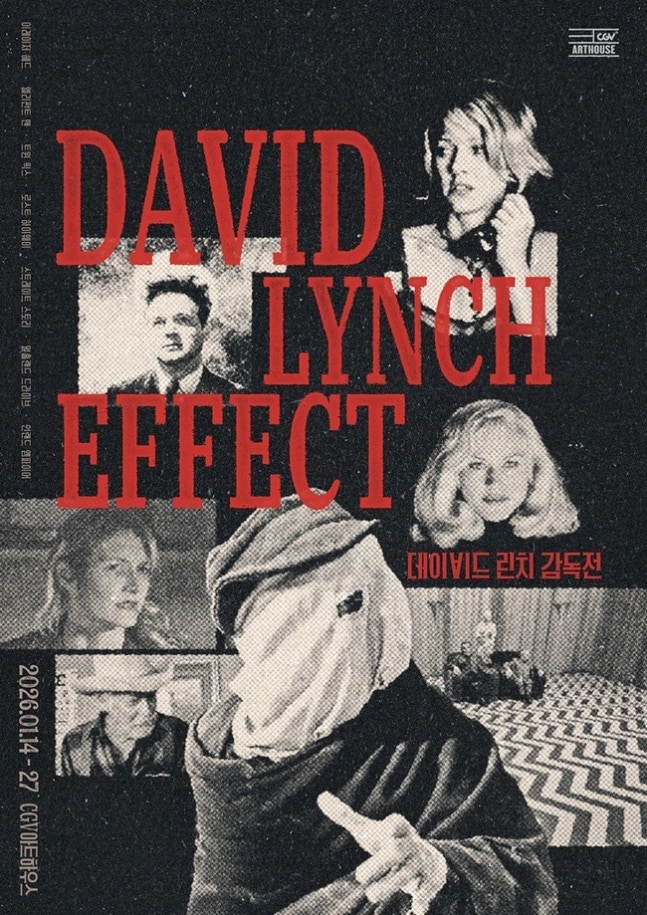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